мӢӨмӢңк°„
л№ лҘёлүҙмҠӨ
м •л¶Җ лҢҖн‘ңлӢЁ, м„ёкі„ліҙкұҙкё°кө¬(WHO) м ң156м°Ё 집н–үмқҙмӮ¬нҡҢ м°ём„қ
ліҙкұҙліөм§Җл¶ҖмҷҖ м§Ҳлі‘кҙҖлҰ¬мІӯмқҖ мқҙлӢ¬ 3мқјл¶Җн„° 11мқјк№Ңм§Җ мҠӨмң„мҠӨ м ңл„Өл°”м—җм„ң к°ңмөңлҗҳлҠ” м ң156м°Ё м„ёкі„ліҙкұҙкё°кө¬(WHO) 집н–үмқҙмӮ¬нҡҢм—җ мҡ°лҰ¬лӮҳлқј лҢҖн‘ңлӢЁмқҙ м°ём„қн•ңлӢӨкі 3мқј л°қнҳ”лӢӨ. 집н–үмқҙмӮ¬нҡҢлҠ” м „ м„ёкі„ 34к°ңкөӯ WHO 집н–үмқҙмӮ¬л“Өмқҙ м°ём„қн•ҙ мқҙлІҲ 5мӣ”м—җ к°ңмөң мҳҲм •мқё м„ёкі„ліҙкұҙмҙқнҡҢ(World Health Assembly)м—җм„ң лӢӨлЈ° мқҳм ңл“Өмқ„ лҜёлҰ¬ кІҖнҶ н•ҳкі мқҳкІ¬мқ„ көҗнҷҳн•ҳлҠ” мһҗлҰ¬лӢӨ. мҡ°лҰ¬лӮҳлқјлҠ” мқҙлІҲ 집н–үмқҙмӮ¬нҡҢм—җ ліҙкұҙліөм§Җл¶Җ л°•лҜјмҲҳ м ң2м°ЁкҙҖ(집н–үмқҙмӮ¬)мқ„ мҲҳм„қлҢҖн‘ңлЎң, н”„лЎңк·ёлһЁмҳҲмӮ°н–үм •мң„мӣҗнҡҢм—җ ліҙкұҙліөм§Җл¶Җ к№Җнҳң진 кё°нҡҚмЎ°м •мӢӨмһҘ(көҗмІҙмқҙмӮ¬)мқ„ мҲҳм„қлҢҖн‘ңлЎң н•ҳкі , ліҙкұҙліөм§Җл¶ҖмҷҖ м§Ҳ
76нҡҢ м•ҪмӮ¬көӯмӢң мқ‘мӢңмһҗ 2184лӘ…, м—ӯлҢҖ мөңлҢҖ кё°лЎқ
[л©”л””нҢҢлӮҳлүҙмҠӨ = мЎ°н•ҙ진 кё°мһҗ] м§ҖлӮң 1мӣ” 24мқј м „көӯм ҒмңјлЎң мӢӨмӢңлҗң 'м ң76нҡҢ м•ҪмӮ¬ көӯк°Җкі мӢң 'мқ‘мӢңмһҗк°Җ 2184лӘ…мңјлЎң м—ӯлҢҖ мөңлҢҖлҘј кё°лЎқн–ҲлӢӨ. мқ‘мӢңмңЁмқҖ 98.8%лӢӨ. 3мқј н•ңкөӯліҙкұҙмқҳлЈҢмқёкөӯк°ҖмӢңн—ҳмӣҗ(көӯмӢңмӣҗ)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қҙлІҲ мқ‘мӢңлҢҖмғҒмһҗ 2210лӘ… мӨ‘ 26лӘ…мқҙ кІ°мӢң, мҙқ 2184лӘ…мқҙ мқ‘мӢңн–ҲлӢӨ. мқҙлҠ” м§ҖлӮңн•ҙ 2071лӘ…ліҙлӢӨ 113лӘ… л§ҺмқҖ мҲҳм№ҳлӢӨ. кө¬мІҙм Ғмқё мқ‘мӢңмқёмӣҗмқҖ 2020л…„ 2126лӘ…, 2021л…„ 1920лӘ…, 2022л…„ 1993лӘ…, 2023л…„ 2015лӘ…, 2024л…„ 2071лӘ…мқҙлӢӨ. л§Ңм•Ҫ мқҙлІҲ м•ҪмӮ¬ көӯк°Җкі мӢң н•©кІ©лҘ мқҙ 91.6%лҘј л„ҳкё°кІҢ лҗҳл©ҙ,
лӘ©н‘ңВ·м„ұкіј кё°л°ҳ мӨ‘мӢ¬мңјлЎң м Ғм •м„ұ нҸүк°Җ к°•нҷ”
кұҙк°•ліҙн—ҳмӢ¬мӮ¬нҸүк°Җмӣҗ(мӣҗмһҘ к°•мӨ‘кө¬, мқҙн•ҳ мӢ¬нҸүмӣҗ)мқҖ м§ҖлӮңлӢ¬ 24мқј '2025л…„лҸ„ мҡ”м–‘кёүм—¬ м Ғм •м„ұ нҸүк°Җ кі„нҡҚ'мқ„ мӢ¬нҸүмӣҗ лҲ„лҰ¬м§‘мқ„ нҶөн•ҙ кіөк°ңн–ҲлӢӨ. м Ғм •м„ұ нҸүк°ҖлҠ” 2001л…„ н•ӯмғқм ң мІҳл°©лҘ нҸүк°Җ л“ұмқ„ мӢңмһ‘мңјлЎң кёүм„ұкё° м§Ҳнҷҳ л°Ҹ л§Ңм„ұм§Ҳнҷҳ, м•” м§Ҳнҷҳ, м •мӢ кұҙк°•, мһҘкё°мҡ”м–‘ л“ұ нҸүк°ҖмҳҒм—ӯмқ„ кі лҘҙкІҢ нҷ•лҢҖн•ҳл©°, мқҳлЈҢ м§Ҳ н–ҘмғҒмқ„ лҸ„лӘЁн•ҙмҳӨкі мһҲлӢӨ. мӢ¬нҸүмӣҗмқҖ мҳҲмёЎ к°ҖлҠҘн•ҳкі мІҙкі„м Ғмқё нҸүк°ҖмҡҙмҳҒмқ„ мң„н•ҙ л§Өл…„ нҸүк°Җкі„нҡҚмқ„ мҲҳлҰҪн•ҙ кіөк°ңн•ҳкі мһҲлӢӨ. мҳ¬н•ҙлҠ” 'лӘ©н‘ңмӨ‘мӢ¬·м„ұкіјкё°л°ҳ нҸүк°ҖлҘј нҶөн•ң мқҳлЈҢмҲҳмӨҖ н–ҘмғҒ'мқ„ лӘ©н‘ңлЎң мЈјмҡ” м „лһөкіјм ңлҘј м„Өм •н•ҳкі , мҙқ 36н•ӯлӘ©м—җ лҢҖн•ң мҡ”м–‘
-
мӮјмқјм ңм•Ҫ, м§ҖлӮңн•ҙ м—°кІ° л§Өм¶ңм•Ў 2198м–өмӣҗвҖҰмӮ¬мғҒ мөңлҢҖл§Өм¶ң лӢ¬м„ұ
мӮјмқјм ңм•Ҫмқҙ м§ҖлӮңн•ҙ м—°кІ°кё°мӨҖ л§Өм¶ңм•Ў 2198м–өмӣҗ, мҳҒм—…мқҙмқө 2м–өмӣҗмқ„ лӢ¬м„ұн•ң мһ м • мӢӨм Ғмқ„ 3мқј кіөмӢңлҘј нҶөн•ҙ л°қнҳ”лӢӨ. м—°кІ° л§Өм¶ңм•ЎмқҖ м „л…„ лҢҖ비 11.9% м„ұмһҘн–Ҳмңјл©°, мҳҒм—…мқҙмқөмқҖ 97.3% к°җмҶҢн–ҲлӢӨ. л§Өм¶ңм•Ўмқҳ кІҪмҡ° м—ӯлҢҖ мөңлҢҖ мӢӨм Ғмқ„ лӢ¬м„ұн–ҲлӢӨ. мөңк·ј мӮјмқјм ңм•ҪмқҖ л§Өл…„ м°ҪмӮ¬мқҙлһҳ мөң
-
мҳҒлӮЁлҢҖмқҳлЈҢмӣҗ, м ң22лҢҖ мқҳлЈҢмӣҗмһҘм—җ к№Җмҡ©лҢҖ көҗмҲҳ м·Ёмһ„
мҳҒлӮЁлҢҖмқҳлЈҢмӣҗмқҖ м ң22лҢҖ мҳҒлӮЁлҢҖ мқҳл¬ҙл¶ҖмҙқмһҘ кІё мқҳлЈҢмӣҗмһҘмңјлЎң мқҙ비мқёнӣ„кіј к№Җмҡ©лҢҖ көҗмҲҳк°Җ м·Ёмһ„н–ҲлӢӨкі 3мқј л°қнҳ”лӢӨ. мһ„кё°лҠ” мқҙлӢ¬ 1мқјл¶Җн„° 2л…„мңјлЎң мҳӨлҠ” 27мқј ліёкҙҖ лҢҖк°•лӢ№м—җм„ң мӢ мһ„ мқҳлЈҢмӣҗмһҘ м·Ёмһ„мӢқмқ„ к°ңмөңн• мҳҲм •мқҙлӢӨ. к№Җмҡ©лҢҖ мқҳлЈҢмӣҗмһҘмқҖ 1987л…„м—җ мҳҒлӮЁлҢҖн•ҷкөҗ мқҳкіјлҢҖн•ҷмқ„ мЎём—…н–Ҳмңјл©°
-
нҒҙлқјлҰ¬нҢҢмқҙ, м•„лһҚн—¬мҠӨ 2025 м°ёк°ҖвҖҰмӨ‘лҸҷмӢңмһҘ кіөлһө к°ҖмҶҚнҷ”
AI мқҳлЈҢмҳҒмғҒ мҶ”лЈЁм…ҳ м „л¬ёкё°м—… нҒҙлқјлҰ¬нҢҢмқҙ(лҢҖн‘ң к№Җмў…нҡЁ)лҠ” мөңк·ј л‘җл°”мқҙ мӣ”л“ң нҠёл Ҳмқҙл“ң м„јн„°м—җм„ң м—ҙлҰ° 2025 л‘җл°”мқҙ көӯм ңмқҳлЈҢкё°кё°м „мӢңнҡҢ(Arab Health 2025, мқҙн•ҳ м•„лһҚн—¬мҠӨ)м—җ м°ёк°Җн–ҲлӢӨкі 3мқј л°қнҳ”лӢӨ. м•„лһҚн—¬мҠӨлҠ” мӨ‘лҸҷ л°Ҹ м•„н”„лҰ¬м№ҙ м§Җм—ӯ мөңлҢҖ к·ңлӘЁмқҳ мқҳлЈҢкё°кё° м „мӢңнҡҢ
-
мЎ°к·ңнҷҚ мһҘкҙҖ "м—°нңҙ кё°к°„ мқ‘кёүмқҳлЈҢмІҙкі„, мӨ‘мҰқнҷҳмһҗ мӨ‘мӢ¬ мһ‘лҸҷ"
[л©”л””нҢҢлӮҳлүҙмҠӨ = мқҙм •мҲҳ кё°мһҗ] мЎ°к·ңнҷҚ ліҙкұҙліөм§Җл¶Җ мһҘкҙҖмқҖ м—°нңҙ кё°к°„ лҸҷм•Ҳ мқ‘кёүмқҳлЈҢмІҙкі„к°Җ мӨ‘мӢ¬нҷҳмһҗлҘј мӨ‘мӢ¬мңјлЎң мһ‘лҸҷн–ҲлӢӨкі нҸүк°Җн–ҲлӢӨ. 3мқј ліҙкұҙліөм§Җл¶Җм—җ л”°лҘҙл©ҙ, мқҳмӮ¬ 집лӢЁн–үлҸҷ мӨ‘м•ҷмһ¬лӮңм•Ҳм „лҢҖмұ…ліёл¶ҖлҠ” мқҙлӮ мҳӨнӣ„ 2мӢң м •л¶Җм„ёмў…мІӯмӮ¬м—җм„ң мЎ°к·ңнҷҚ м ң1м°ЁмһҘ мЈјмһ¬лЎң нҡҢмқҳлҘј к°ңмөңн–ҲлӢӨ. мқҙлӮ
лӢ№мӢ мқҙ
мқҪмқҖ분야
мЈјмҡ”кё°мӮ¬
 м№ҙм№ҙмҳӨмұ„л„җ추к°Җ
м№ҙм№ҙмҳӨмұ„л„җ추к°Җ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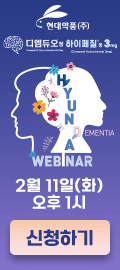


 н•ңкөӯліҙкұҙмӮ°м—…진нқҘмӣҗмқҖ м„ұк· кҙҖлҢҖн•ҷкөҗ мқҳкіјлҢҖн•ҷ м•Ҳм§Җмқё көҗмҲҳ м—°кө¬нҢҖмқҙ м•Ңмё н•ҳмқҙлЁём„ұ м№ҳл§ӨмҷҖ кҙҖл Ёлҗң лӢЁл°ұм§Ҳмқё лҸ…м„ұ м•„л°ҖлЎңмқҙл“ң лІ нғҖмҷҖ EBP1(ErbB3 Binding protein 1) лӢЁл°ұм§Ҳ л°ңнҳ„ ліҖнҷ”м—җ л”°лҘё л°ңлі‘кё°м „мқ„ л°қнһҲкі , мӢӨм ң нҷҳмһҗмҷҖмқҳ м№ҳл§Ө мң мӮ¬лҸ„лҘј лҶ’мқё лҸҷл¬јлӘЁлҚёмқ„ м ңмӢңн•ҳлҠ” лҚ° м„ұкіөн–ҲлӢӨкі 3мқј л°қнҳ”лӢӨ.
н•ңкөӯліҙкұҙмӮ°м—…진нқҘмӣҗмқҖ м„ұк· кҙҖлҢҖн•ҷкөҗ мқҳкіјлҢҖн•ҷ м•Ҳм§Җмқё көҗмҲҳ м—°кө¬нҢҖмқҙ м•Ңмё н•ҳмқҙлЁём„ұ м№ҳл§ӨмҷҖ кҙҖл Ёлҗң лӢЁл°ұм§Ҳмқё лҸ…м„ұ м•„л°ҖлЎңмқҙл“ң лІ нғҖмҷҖ EBP1(ErbB3 Binding protein 1) лӢЁл°ұм§Ҳ л°ңнҳ„ ліҖнҷ”м—җ л”°лҘё л°ңлі‘кё°м „мқ„ л°қнһҲкі , мӢӨм ң нҷҳмһҗмҷҖмқҳ м№ҳл§Ө мң мӮ¬лҸ„лҘј лҶ’мқё лҸҷл¬јлӘЁлҚёмқ„ м ңмӢңн•ҳлҠ” лҚ° м„ұкіөн–ҲлӢӨкі 3мқј л°қнҳ”лӢӨ.






![[нҳ„мһҘ] '2024 м„ёкі„ л°”мқҙмҳӨ м„ңл°Ӣ' мқёмІңм„ң к°ңл§ү](/upload/editor/20241111141025_22E07.jpg)
![[нҸ¬нҶ ] л°•лҜјмҲҳ 2м°ЁкҙҖ, м ңмЈјлҸ„ л°©л¬ёвҖҰмғҒкёүмў…лі‘ м§Җм • нҳ„мһҘм җкІҖ](/upload/editor/20241108102827_ACFD7.jpg)

лҸ…мһҗмқҳкІ¬
мһ‘м„ұмһҗ 비л°ҖлІҲнҳё
0/200
мңӨ**53분 м „
мҶҢм •мқҳ м„ұкіј кё°лҢҖн•©лӢҲлӢӨ. көӯмӮ¬ м„ұк· кҙҖмһҗкІ© е®®м„ұк· кҙҖлҢҖ. Roylм„ңк°•лҢҖ(м–‘л°ҳ м„ұлҢҖ лӢӨмқҢ к°ҖнҶЁлҰӯкі„ к·ҖмЎұлҢҖн•ҷ мҳҲмҡ°). лҒқ. мқҙ л’ӨлЎң мЈјк¶Ң.н•ҷлІҢм—ҶлҠ” кІҪм„ұм ңлҢҖ нӣ„мӢ м„ңмҡёлҢҖмҷҖ к·ё лҜёл§Ң лҢҖн•ҷл“Ө. https://blog.naver.com/macmaca/223528462438
мһ‘м„ұмһҗ 비л°ҖлІҲнҳё
0/200